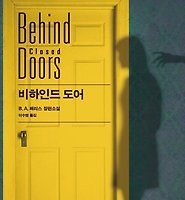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 아트 토이
- 주방용품
- 프로덕디자인
- 램프
- 인테리어 사진
- 조명
- 일러스트레이션
- 가구디자인
- 애플
- 조명 디자인
- 재미있는 광고
- Product Design
- 가구 디자인
- 피규어
- 조명디자인
- 킥스타터
- 일러스트레이터
- 진중권
- 미술·디자인
- 해외 가구
- 인테리어 조명
- 조명기구
- 인스톨레이션
- 북유럽 인테리어
- 프로덕트디자인리서치
- 글쓰기
- 피규어 디자이너
- 신자유주의
- 인테리어 소품
- 가구
- Today
- Total
deadPXsociety
종의 기원_아득한 어둠의 길 본문
한국 문학계의 싸이코패스라 불리는 정유정 작가의 신작이다. <7년의 밤>에서 무시무시한 살육극을 보여줬던 악녀의 귀환. 이번에도 그녀의 관심은 인간의 근원적 악과 그 악행이 연출하는 카니발이다.
전작 <7년의 밤>이 산꼭대기에서 시작해 줄곧 내리막길을 걷는 요상한 작품이었다면(흥미 곡선이 절정, 위기보다 발단이 높은 몇 안되는 책이다) <종의 기원>은 시종일관 늪지를 헤매는 책이다. 사람은 커녕 고기도 한 번 먹어본 적 없는 척, 점잖은 악어 한마리가 물 밑에서 잠행을 한다. 그러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쓱, 물 위로. 어머, 넌 참 착한 악어구나. 반갑게 인사한다. 악어가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리고는?
정유정이 이 시들한 이야기에 <종의 기원>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인간이라는 종의 본질이 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것 같다. 정유정은 종의 진화 과정이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나의 생존=타자의 죽음"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싸이코패스라는 독특한 정신적 기질이 유전자에 각인된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싸이코패스의 행동과 유전자의 행동은 비슷한 점이 많다. 역사를 돌아보며 그 피비린내에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하는 건 우리의 의식이지 유전자가 아니다. 의식이란 무의식을(유전자의 행동)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감옥이다. 이 감옥은 윤리, 도덕, 신뢰, 공감 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간수들이 지킨다. 이 중 몇몇 간수가 사라졌거나, 죽었거나, 애초에 태어난적 없는 사람은 무의식이 행동으로 발현되고 우리는 그것을 싸이코패스라 부르는 것이다.
유전자가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낄까? 유전자는 오직 하나의 법만을 따른다. 생존. 이를 위해선 복잡한 작동 구조가 필요없다. 아니, 오히려 그건 치명적 약점이 된다.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후손에게 자신의 형질을 물려주기 위한 결정적 순간마다 이것이 맞는가, 이 행동이 옳은가를 따진다면 이미 늦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를 알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더라도 근처에 다가오는 순간 척, 하고 붙을 수 밖에 없는 것처럼 기회를 얻었을 때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다. 유전자에게 윤리를 바라는 건 선로 위에 놓인 나뭇잎이 자기를 밟고간 기관차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 기관차는 뻔뻔하거나 사악하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왜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 없다.
인간의 어둠에 집착하는 작가라면 이는 평생에 걸쳐 고민해볼만한 주제이다. 하지만 이 고민을 평생의 과제로 삼는 것과 그것을 작품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곳은 너무나 어둡고 깊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기획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실제 책상 앞에 앉아 문장을 적는 순간 아주 끔찍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작가는 과연 그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악한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짓는 잣대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는 있어도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는 없다. 설령 우리가 그걸 완벽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작가는 결코 그것을 묘사해선 안 된다. 싸이코패스의 마음을 세세히 읽게 된다면 그 불가사의한 악의 존재감을 독자가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 그건 패를 다 까고 치는 포커보다도 재미가 없을 것이다.
정유정은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을 쓰는 과정이 너무나 힘겨웠으며 삼인칭으로 기술하던 주인공을 일인칭으로 바꾸고 나서야 어느 정도 전개를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실수다. 소설은 끝까지 삼인칭으로 남았어야 한다. 심리를 드러내는 싸이코패스는 딸기를 좋아하는 지렁이만큼이나 어색하다. 정유정은 싸이코패스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만들어진 싸이코패스를 묘사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주인공은 그저 싸이코패스가 되고 싶은 중2병 풋내기처럼 보인다.
그들을 다루는 불문율은 그들의 심리를 묘사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첫 일초부터 마지막까지 이 규칙을 지키는 영화 두 편을 알고 있다. 하나는 코맥 매카시의 원작을 영화화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하나는 데이비드 핀처가 일부 에피소드를 연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인드 헌터>다. 싸이코패스가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다면 이 영화들을 보라. 아무런 위화감도 없이, 아무런 위협도 없이, 꿈결처럼 다가와 슥, 목을 베고 가는 섬뜩한 괴물들. 그 천진난만함을 보고 나면 <종의 기원>이 낳은 갈증이 한방에 날아갈 것이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하인드 도어_고속도로 휴게소의 잔치국수 (0) | 2018.01.14 |
|---|---|
| 10개의 특강으로 끝내는 수학의 기본 원리_간결하고, 아름답고, 우아하다 (0) | 2018.01.07 |
| 배반_검은 얼굴의 요사리안 (0) | 2017.12.24 |
| 작은 겁쟁이 겁쟁이 새로운 파티_행복한 남자를 위해 내가 쏜다 (0) | 2017.12.17 |
| 신경끄기의 기술_무한긍정 자기계발서에 침을 뱉자 (2) | 2017.12.10 |